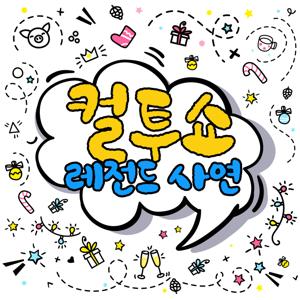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전형적인 1965년 방식이다. 정권이 합의한다고 과연 '집단 기억'이 잊힐까? 과거를 대하는 독일의 자세와는 차이가 크다. 독일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기념하고 공유했다. 기억과 성찰이 화해의 근거였고, 민주주의의 동력이었다. 독일은 법적 혹은 경제적 책임에도 적극적이었다. 독일의 기억과 책임이 유럽의 미래를 열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도 과거가 미래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철학의 빈곤 때문이다. 매듭짓지 못한 역사는 예기치 않은 시점에 훨씬 악화된 형태로 삐져나와 반드시 복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H]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https://podcast-api-images.s3.amazonaws.com/corona/show/69249/logo_300x300.png)

 View all episodes
View all episodes


![[H]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https://podcast-api-images.s3.amazonaws.com/corona/show/69249/logo_300x300.png) By http://www.humanistbooks.com
By http://www.humanistbook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