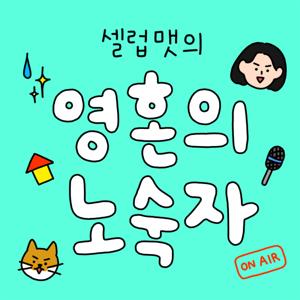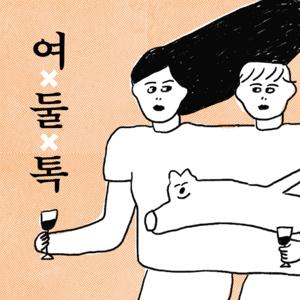1. "내가 (재판부에게) 들은 질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장에서 선고문에 글자로 적힌,
진실을 찾아간 그것들을 육성으로 들은 것이다."
2. “한국사회는 성범죄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없다.
이것을 너무 사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다보니
공적인 장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 그림 자체를 못 그리는 것이다.
여성운동이 계속되고 미투가 일어나면서 이제서야 조금씩 이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건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논의하고 대응할까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3, 빚투따위의 말들을 비판 없이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언론문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피해자다움,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결정권..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언론에 정착되어서 이제는 ‘쓸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이다.
4.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여성의 언어로, 여성의 관점으로 다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종편에 나오는 이상한 변호사들의 분석말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을 듣고 싶다.
더 많이 말해달라. 더 크게 말해달라"





 View all episodes
View all episodes


 By 여력이되네
By 여력이되네